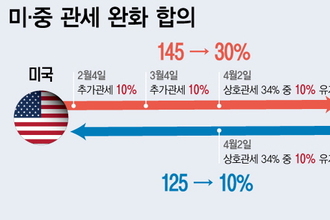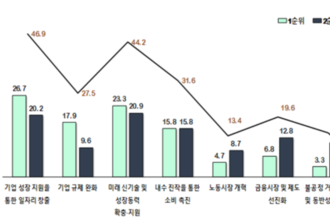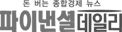[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기자] 2021년말 기준으로 글로벌 TOP100 명품 기업의 연간 매출액은 3,050억 달러(한화 약 411조 원)를 기록하며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는 규모까지 회복하였으며, 매출 기준 TOP 100기업의 순이익률 또한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상위 TOP 10 기업이 전체 명품업계 매출 회복을 견인하였다.
K-뷰티를 대표하는 아모레퍼시픽은 TOP100에 한국브랜드로는 유일하게 신규 진입하였다. 럭셔리 및 프리미엄 뷰티를 주력으로 하는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두 자릿수 성장률(11.6%)을 보이며 19위를 기록했다.
명품업계는 순환 경제 실현을 위한 비전을 수립하고 연구 발전을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ID도입과 중고 리테일 시장 진입 및 활성화로 사회적 지속가능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또, 메타버스 및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가상세계로 브랜드를 확장하고 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총괄대표 홍종성)은 팬데믹 충격에서 벗어난 글로벌 명품 시장의 현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트렌드를 조명한 '글로벌 명품 산업 2022: 열정의 새 물결' 보고서 국문본을 발행하면서 위와 같이 밝혔다.
■ 글로벌 명품 업계, 21년 기점으로 매출액 3,050억 달러로 코로나 이전 수준 상회
2021년 글로벌 명품 시장은 팬데믹의 공포에서 벗어났다. 2021년 글로벌 톱100 명품 기업의 연간 매출액은 3,050억 달러로 전년 2,520억 달러에서 21.5%나 크게 반등했으며,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2,810억 달러 매출도 상회하는 수치다. 팬데믹 기간 잠시 멈췄던 M&A 및 파트너십 체결도 2021년과 2022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글로벌 명품 시장에서 톱10 기업의 리더십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2021년 기준 전체 톱100 기업 매출 중 톱10 명품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6.2%로 전년 대비 4.8%p 증가했으며, 매출 증가분 중 81.4%, 순이익 중 84.7%를 차지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LVMH의 경우 2021년 톱10 기업 매출의 32%를 책임지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한편, 한국의 아모레퍼시픽을 포함 유니레버, 소마패션그룹, 랑방그룹 등 총 10개 기업이 2021년 매출 기준 TOP100 기업으로 신규 진입했다. 대표적인 명품 전자 상거래 기업인 ‘파페치’가 최근 3년간(2018-2021년 기준)연평균성장률이 104.7%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기업으로 꼽혔다.
■ 착한 기업으로 거듭나는 명품업계, 친환경 전환 및 순환 경제 모델 통해 지속가능성 실현
패션 및 명품 산업의 생산 공정과 소비 관행은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최근의 명품 브랜드들은 지속가능성을 우선 순위로 삼고 기업의 핵심전략에 반영하고 있다.
한단계 나아가 순환 경제 모델로 발전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폐기물, 탄소 배출 및 오염을 줄이고 내구성 있는 제품을 만들어 폐기를 최소화하고 기관, 경쟁사, 연구기관 및 전문가 등 생태계 파트너와 협업해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고 제공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다.
기업은 기관, 경쟁사, 연구기관 및 전문가 등 생태계 파트너와 협업해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고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돌체앤가바나(Dolce & Gabbana), 프라다(Prada) 그룹, 막스마라(Max Mara) 패션 그룹, 오티비(OTB), 몽클레르(Moncler), 에르메네질도 제냐(Ermenegildo Zegna)그룹이 이탈리아국립패션협회(Camera Nazionale della Moda Italiana)와 함께 섬유 패션 제품의 재활용 연구 개발을 위해 리크레아 컨소시엄(Re.crea consortium)을 출범했다.
또, 경제 및 수집 목적을 넘어 환경을 생각하는 명품 리세일 시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소비자들의 소비성향에 반영됨에 따라 일부 애호가들의 영역이던 중고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들 역시 중고시장을 통해 지속가능성 확보와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힘쓰고 있다.
스텔라 매카트니(Stella McCartney), 케어링 그룹, 발렌시아가(Blenciaga) 등의 명품기업들이 플랫폼과의 협업과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리세일 시장에 참여하며 순환경제모델을 실현 중에 있다.
■ 가상매장 오픈하고 패션쇼도 메타버스에서 펼치며 가상세계로 브랜드 확장 중
명품 기업들은 팬데믹 기간 오프라인 매장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자 새로운 컬렉션을 공개하고 브랜드 내러티브를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 공간인 메타버스를 비롯해 아바타 및 NFT 등 신기술에도 주목했다.
구찌(Gucci)는 로블록스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랄프로렌(Ralph Lauren)은 2021년 제페토에서 50개의 컬렉션을 런칭하기도 했다.
루이비통(Louis Vuitton)은 창립자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자체 메타버스 비디오 게임인 루이 더 게임을 출시하기도 했다.
또 티파니앤코(Tiffany & Co)는 지난 8월 크립토펑크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정판 맞춤형 팬던트 엔에프티프를 출시해 큰 인기를 끌었다.
메타버스에서 패션쇼도 열렸다. 디센트럴랜드(Decentraland)는 뉴욕, 런던, 파리, 밀라노의 4대 패션위크가 마무리된 직후인 2022년 3월 세계 최초의 메타버스 패션위크(MFW)를 개최해 화제가 됐다.
심현보 모니터 딜로이트 부문장은 “인간의 중요한 본성 중 하나인 ‘구별 짓기’ 욕망에 소구하는 글로벌 명품 기업들은 팬데믹 이후 다시 예년 수준의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한다” 면서 “명품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및 메타버스와 같은 ICT 기술에 큰 관심을 두는 상황에서 입체적인 시장 전략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