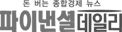가정과 집안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하는 엄마들에게 '노후 대비', '자산 마련'은 멀고 먼 이야기다. 본인 스스로가 나서서 준비할 여력이 부족한데다 정부의 각종 금융자산 형성 지원 대상에서도 주부들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가정과 집안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하는 엄마들에게 '노후 대비', '자산 마련'은 멀고 먼 이야기다. 본인 스스로가 나서서 준비할 여력이 부족한데다 정부의 각종 금융자산 형성 지원 대상에서도 주부들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5~79세 고령층 여성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은 31만원으로, 67만원인 남성 월평균 수령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적절한 연금 가입 시기를 놓치거나 아예 연금을 가입하지 않는 등 여성들의 미흡한 노후 준비 상황을 보여주는 수치다.
문제는 정부의 공공 정책에서도 중년 여성이 배제되고 있어 자산 마련의 기회가 희박하다는 점이다
내년 출시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정부가 서민의 재산마련을 위해 투자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키로 한 절세상품이다.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과 소득 증빙이 안되는 주부나 은퇴자는 가입할 수 없다.
퇴직연금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2005년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호주를 비롯해 미국에서는 가입 대상 범위를 폭넓게 설정해 가정주부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우리나라는 주부는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나마 최근 경력단절 여성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됐지만, 이마저도 가입을 꺼리는 주부들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최저 납입기준이 8만9100원부터 시작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라도 과거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그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납입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해 국민연급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주부들의 금융 소외는 우리나라의 노령 여성 빈곤과도 무관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알리안츠그룹이 지난해 '세계 노년 여성들의 빈곤 리스크'를 조사한 결과 65세 이상 한국 여성들의 빈곤율은 47.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 중 가장 높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현주 연구위원은 "여성 독신가구의 경우에는 조금씩 제도들이 생기고 있지만, 남편이 있는 주부들은 금융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부가 본인 앞으로 자산이 모아진 게 없고 상속이나 증여가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혼자가 되면 노인 빈곤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여성 주부 가구의 자산이 적은데도 금융 지원 활성화 고려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경향이 있다"며 "민간 보험상품이나 대출 상품으로만 있고 자산 마련을 위한 공공 정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우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전업주부는 노후 대비에 있어서 남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면이 있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황혼이혼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여성의 생애주기가 남성보다 길어지면서 여성들의 노후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