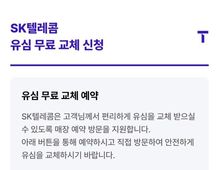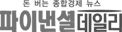‘소녀괴담’이 가장 먼저 개봉해 48만여 명을 모았다. 귀신을 보는 소년과 소녀귀신의 사랑이야기라는 공포와 멜로의 혼합 장르를 내세웠다. 그럼에도 어딘에선가 본 듯한 장면을 남발하며 기존의 공포물 틀을 벗지 못했다. 제작비 9억원을 들인 저예산 영화로 손익분기점을 넘기긴 했지만, ‘흥행 성공’이라고 볼 수는 없다.
17일 개봉한 박한별(30) 주연 ‘분신사바2’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2년 전 자살한 친구와 관련된 의문을 파헤치며 드러나는 끔찍한 이야기를 담은 학원 공포물이다. ‘폰’ ‘가위’ 등을 연출한 안병기 감독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누적관객 수 10만 명을 넘기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3일 개봉한 ‘내비게이션’은 관객수를 언급하기도 민망할 정도다.
불과 5~6년 전 만해도 이 지경은 아니었다. 신인 여배우의 등용문으로 통하던 ‘여고괴담’은 최강희, 박한별, 송지효, 공효진, 박예진 등 스타를 배출했다. 유지태 주연 ‘거울 속으로’(72만 명·2003)와 임수정·문근영 주연 ‘장화홍련’(314만 명·2003)은 작품성도 인정받아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되기도 했다.
황정민 주연 ‘검은 집’(132만 명·2007), 김혜수의 ‘분홍신’(137만 명·2005), 박진희의 ‘궁녀’(143만 명·2007)를 비롯해 ‘고사: 피의 중간고사’(163만 명·2008) ‘알 포인트’(168만 명·2004) ‘여고괴담-여우계단’(178만 명·2003) ‘여고괴담’(약 200만 명·1998) ‘폰’(약 220만 명·2002) 등도 100만 명을 넘기며 흥행성공의 단맛을 봤다.
하지만 2010년 이후 100만 명을 넘긴 공포영화는 지난해 ‘더 웹툰: 예고 살인’ 하나 뿐이다. ‘화이트: 저주의 멜로디’(79만 명·2011), ‘고사: 두 번째 이야기 교생실습’(85만 명·2010), ‘미확인 동영상: 절대클릭금지’(86만 명·2012)는 100만 관객 대열에 들지 못했다.
공포영화의 몰락은 진부한 소재에서 찾아야 한다. 한, 원혼, 저주 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청소년문제, 왕따 등 사회적 이슈를 녹여넣는 것도 더 이상 신선하지 않다. 아이디어 부재를 과장된 청각효과, 갑작스러운 귀신의 등장 등 1차원적 공포도 상쇄할 수는 없다. 공포물의 타깃인 10대들의 눈도 높아졌다.
영화계 관계자는 “공포가 결코 쉬운 장르가 아닌데 다들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몇몇 감독들은 귀신으로 깜짝 놀라게 하고, 음침한 사운드만 넣으면 공포영화가 되는 줄 안다”고 지적했다.
투자·배급도 쉽지 않다. 지난해 ‘더 웹툰: 예고 살인’으로 재미를 본 CJ엔터테인먼트는 올해 국내산 공포물 배급에서 손을 뗐다. “‘더 웹툰: 예고살인’의 경우 장르가 새로웠다. 베트남에서 역대 한국 영화 흥행성적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면서도 “대부분의 공포물에 관객들이 지쳤다. 전반적으로 장르가 새롭지 않다. 여전히 여고생, 학원물이 많고 신선한 소재 발굴이 안 되다 보니 관객들의 외면을 받게 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상대적으로 제작비가 적게 들고 제작기간도 짧아 국내외 블록버스터들에 밀리며 설 곳을 잃었다는 분석도 있다. 3분의 1 수준 제작비로 100억원대 대작들을 상대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상영관 확보가 어렵기만 하다.
투자배급사 쇼박스 관계자는 “공포물이 한 해 4작품이 나와도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것은 한 개 정도다. 마니아층이 있지만, 공포를 찾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할리우드와 한국 대작이 깔리면 공포물과 같은 규모가 작은 영화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전했다.





!["장식 없이 지하에"…교황청, 유언장 공개[교황 선종]](http://www.fdaily.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417/art_174530427798_24cd29_330x220_c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