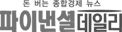북한주민들에겐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아 마음대로 이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환경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사는 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행복한 통일'에 게재한 '북한의 이사와 주거생활'이란 글에서 "북한에는 이사철이라는 것이 없다"며 "북한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북한 간부들은 보직이동을 할 경우 자연스럽게 이사를 할 수 있지만 일반주민들은 자기의 의사나 적성에 관계없이 당국에서 배치하는 직장에서 일해야 한다. 도중에 직업을 바꿀 수 있는 자유도 없다. 따라서 이사를 하기가 어렵다.
직업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당국의 허가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김 박사는 "평범한 주민들의 경우에는 마음에 드는 지역이나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보다 힘들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에서는 이사를 하려면 먼저 각 시·군 인민위원회 주택배정과에 가서 주택사용을 허락한다는 증서인 주택사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주택배정과는 주민들에게 새로 지은 주택을 배정하거나 기존 주택의 사용권을 조절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주택배정과로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사용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이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배정과가 부여하는 것은 주택 사용권이지 주택 소유권이 아니다. 주택을 비롯한 북한의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은 100% 국가소유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2층 이상 주택(연립주택)은 아파트로 불린다. 단층짜리 주택은 주택·단층집·땅집으로 불린다. 단층짜리이면서 여러 가구가 붙어 있는 형태의 주택은 하모니카처럼 생겼다는 이유로 '하모니카집'으로 불린다.
북한의 평양이나 함흥·원산 등 대도시에는 상대적으로 아파트가 많은 편이지만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에는 단층주택이나 2~3층짜리 연립주택이 대부분이다. 층수가 높은 아파트를 지으려면 강재와 시멘트가 많이 필요한데 그럴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란 게 김 박사의 설명이다.
특히 농촌지역에는 문화주택으로 불리는 흙벽돌로 지은 단층짜리 단독주택이 많다. 문화주택은 1960년대 초반에 지어진 방 2칸에 부엌이 딸린 단독주택으로 북한 농촌지역의 주요 주거시설이다.
북한 농촌지역에는 초가집도 아직 많다. 북한은 1980년 진행된 노동당 제6차 대회를 앞두고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개량하는 작업을 실시했지만 아직 일부 지역에는 초가집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내 시설도 열악하다. 김 박사에 따르면 북한 아파트에는 구들장과 아궁이가 있다. 연료난으로 발전소나 보일러 가동이 잘 되지 않으므로 난방이 안 될 경우 불을 때 방을 덥히기 위해 아궁이를 둔 것이다.
아궁이마저 설치하지 못한 아파트 주민들은 집안에 비닐텐트를 설치한다. 김 박사는 "온 가족이 옷을 껴입고 텐트 안에 들어가 서로 부둥켜안고 체온으로 텐트 내부를 덥히면서 잠을 청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내 전기 공급도 큰 애로사항이다. 일반주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서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전이 자주 되고 단전시간도 길어 냉장고가 거의 필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기가 부족해 전열기처럼 전력이 많이 소모되는 가전제품은 사용이 통제된다.
아파트 물 문제도 심각하다. 수돗물 생산·공급이 여의치 않아 식수만 겨우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마저도 안 되면 지하수를 떠와서 생활용수로 써야 한다.
겨울에 온수가 나오는 아파트는 최고위급 간부들이 사는 고급아파트 외에는 거의 없다. 이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냄비에 물을 끓여 찬물을 섞은 다음 그 물에 적셔낸 수건으로 몸을 닦아내는 식으로 샤워를 대신한다고 김 박사는 설명했다.
다만 북한 주거문화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북한당국이 주민들로부터 자금을 걷기 위해 주택 사용권 거래를 허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당국은 주택배정과 산하에 주택거래소를 설치해 기존주택 사용권 거래업무를 관장토록 하고 있다. 주택거래소는 개인들로부터 주택사용권 매매를 위탁받아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국가에 납부하는 식이다.
김 박사는 "최근 평양의 고급 아파트 1채 가격이 30만달러씩 한다는 소문이 돈다"며 "물론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 소유권에 대한 매매가격이 아니라 아파트 사용권에 대한 매매가격"이라고 설명했다.